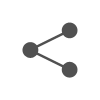나의 10번째 여름, 수영에 막 재미를 붙이던 때다. 배영이 처음이었던 나는 온 신경을 두 다리에 집중하고 힘차게 물장구를 쳐댔다. 하지만 레인이 끝나기도 전에 멈춰야 했다. “끝까지 가야 해!”라는 선생님의 불호령에도 꼼짝없이 수영장 벽에 몸을 기댄 채. 마치 사타구니와 외음부 전체가 불타는 것 같아 어쩔 줄 몰랐는데, 그 증상이 사그라지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동시에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같다. 분명한 건 다리의 경련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 이후로 나는 양쪽 허벅지를 순간적으로 조이면 허벅지가 덜덜 떨리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물론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거나 힘을 빼고 수영하면 그 즐거움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다). 그 정체를 알기 전까지는 즐거움과 죄책감이 마구 뒤섞였다. 일찍이 누군가 “허벅지와 외음부에 혈류량이 증가하고 내전근에 과하게 힘이 실리면서 나타나는 오르가슴의 일종이란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야”라고 얘기해줬더라면 근심은 덜었을 텐데.
한국 여성의 오르가슴 실태를 들여다보면 “오르가슴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할까(알고 느끼는 것과 모르고 느끼는 것은 천지 차이지, 암). 오르가슴이지만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면 부담감이나 불편함을 느껴 오르가슴이 오기도 전에 피해버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 위의 열 살 꼬마가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둔 것처럼 여성이라면 각자의 성감대를 탐구하고 오르가슴에 이르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니 그래야만 한다. 분명 남성의 오르가슴보다 복합적이긴 하지만 신비롭고 이해하기 힘든 영역을 넘어 이미 일상생활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다.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은 것처럼 오르가슴도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
- 에디터김민지 (minzi@lether.co.kr)
- 사진언스플래쉬